지금 생각해보면 미쉘 모랑쥬의 <분자생물학: 실험과 사유의 역사>를 몇번이고 되내이며 읽을 수 있었던건, 진화생물학처럼 흥미진진한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없는 분자생물학의 역사에서 그나마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책이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물론 지금은 그 책을 다시 펼쳐 읽을 생각이 없다. 모랑쥬가 요즘은 뭘 하는지도 찾아본 적 없고, 관심도 없다.
곧 김영사에서 네번째 책 <꿈의 분자 RNA>가 출판된다. 이 책은 내 첫 장기연재작품인 <미르 이야기>와 동아사이언스 <보통 과학자>에 연재했던 mRNA 백신에 관한 내용을 엮고 재편집한 작품이다. 과학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다루었지만, 역시나 과학사와 과학과 사회의 접점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는 김우재 표 과학책이다. 그러니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지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되지 못한 독자는 읽어낼 수 없다. 당연히 책이 팔린다면 기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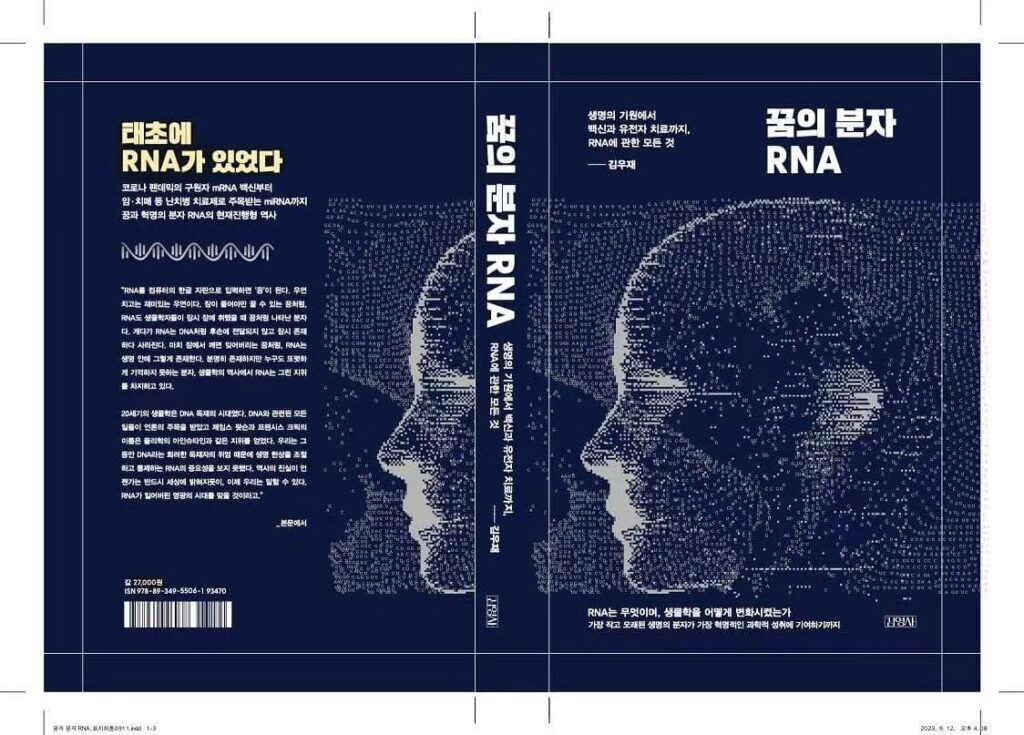
책 홍보를 위한 짧은 슬라이드를 준비하다가, 내 책 <플라이룸>에서 만들었던 ‘두 개의 생물학’에 대한 도식을 한번 만들어봤다. 어쩌다보니 분자생물학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RNA라는 분자가 생물학사에 등장해서 혁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두 생물학과 분자생물학의 시작에 관한 짧은 역사 정도는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먼저 이 슬라이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슬라이드 중 하나인데, 보통 사람들은 다윈이 파스퇴르보다 한 100년은 오래된 과학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그렇지 않다. 다윈과 파스퇴르는 동시대 영국과 프랑스에서 생물학을 연구했던 과학자들이다. 이 둘 사이의 거리감이 바로 ‘두 개의 생물학’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가운데 멘델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분자생물학의 시작을 의미하는 유전학의 역할이다. 유전학, 즉 DNA라는 유전물질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학문 덕분에 분자생물학이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분자생물학이 DNA에 관한 학문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학문의 역사를 티비로만 배운 어설픈 지식인이다. 만약 누군가 왓슨과 크릭만 알고 있다면, 자코브와 모노는 모르나보네?라고 되받아줄 수 있다. 분자생물학의 진정한 서막은 프랑스 레지스탕스 출신의 두 생물학자 자코브와 모노가 열었다.

실험실에서 담배 피우는 모노의 포스를 보면, 왓슨과 크릭이 얼마나 보잘 것 없어 보이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둘은 크릭조차 상상도 하지 못했던 DNA에서 단백질로 가는 경로와 유전자발현의 조절이라는 현상을 설명해줄 기틀을 마련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이들의 공로 덕분에 현재와 같은 형태의 분자생물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모랑쥬는 분자생물학을 유전학과 생화학의 결합으로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자코브와 모노가 발견했고 그 시대의 오래된 생리학자들이 발견하려 했던 유전자발현이라는 현상과 이를 설명하는 생리학의 존재를 무시했다. 생리학의 존재 없이는, 현대 분자생물학의 완성을 이야기할 수 없다. 프랑스 분자생물학파에 대한 연구에 지나치게 몰입한 탓인지, 모랑쥬는 그 단순명쾌한 사실을 그의 책에 담지 못했다. 그렇다고.
왓슨, 크릭 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