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10년을 고생해서 출판한 논문이 있다. 겨우겨우 PLOS Genetics 에 출판된 논문은 Nature에서 시작해서 Nature Communications를 거쳐 eLife에서 모두 리비전 후 리젝되었다. 대학을 옮기는 와중에 진행된 그 과정만 5년이 걸린 것 같다. 대학을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도 어쩌면 그 논문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Lee, S. G., Sun, D., Miao, H., Wu, Z., Kang, C., Saad, B., … & Kim, W. J. (2023). Taste and pheromonal inputs govern the regulation of time investment for mating by sexual experience in male Drosophila melanogaster. PLoS Genetics, 19(5), e1010753.
당시만 해도 eLife는 꽤나 잘나가는 학술지였고, 임팩트 팩터 (IF)는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의생명과학자들은 모두 eLife에 실린 논문을 존중하는 분위기였다. 노벨상 수상자가 만든 학술지이기도 했고, HHMI, Welcome Trust, 막스플랑크 등의 거대한 재단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이 학술지는 곧 네이처 등의 거대학술지를 무찌를 것처럼 보였다. 물론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며칠 전에 생물학계에선 꽤나 시끄럽던 뉴스가 있었다. 그건 바로 Clarivate가 Science Citation Index(예: Research Professional ) 에 eLife 출판물을 포함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이 말이 뜻하는 건 분명했다. Clarivate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과학학술지 인덱스인 Web of Science에서 더이상 eLife의 논문들을 과학논문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Pubmed나 Google Scholar 같은 플랫폼에선 eLife의 논문을 검색하고 찾을 수 있다. 하지만 WoS에서는 찾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eLife는 현재 연구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지수 Impact Factor (IF)에서 절대적인 열세를 갖게 된다. 안 그래도 그다지 높지 않은 IF를 가지고 있던 eLife에 이제 더이상 더 높은 IF에도 충분히 논문을 낼 수 있는 연구자들은 굳이 논문을 출판하려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물론 IF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꽤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선 IF는 연구자에 대한 절대적 평가지수로 기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IF를 좋아하지 않는 연구자들조차 이번 eLIfe의 WoS 인뎅싱 제외가 자신의 eLife 논문 제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IF가 떨어져도 논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읽히지 않는다면, 그 학술지를 고려할 동기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럼 eLife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클라리베이트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일까? 작년 초부터 eLife는 일단 에디터를 통과해서 리뷰어들에게 리뷰를 받은 논문은 출판된 것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 오래된 논문출판의 관행과 IF의 문제점 등을 혁신하고 싶었던 eLife 관계자들의 진심을 의심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급진적인 아이디어는 연구자들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했다. 특히 과학출판에 대해 깊게 공부하고 대안을 고민해왔던 나에게도, eLife의 아이디어는 $2,000에 논문 출판권을 파는 행위로 보일 정도였다. 실제로 eLife에 투고된 논문 숫자가 급증했고, eLife의 출판된 논문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 일단 리비전에 들어가면, 저자는 아무 단계에서나 논문 리비전을 중단할 수 있고, 리뷰어의 요구도 거절할 수 있다. 논문은 그 상태 그대로 게재되며, 리뷰어의 의견도 그대로 게재된다. 하지만 누가 굳이 논문에 대한 리뷰어의 평가를 따라가서 읽겠는가. 당연히 대부분의 저자들은 일단 $2000을 내고 리뷰를 받게 되면 거기서 멈추고 말 것이다. 굳이 더 노력을 기울일 동기가 부여될 수 없는 시스템 속에서 인간의 선한 의지만 믿고 이런 제도를 만들면 실패하고 만다. 나 역시 만약 eLife에 논문을 내게 된다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급하게 출판해야 하는 논문 정도만 고려할 것이다. 당연히 eLife는 IF뿐 아니라 연구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eLife의 이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대충 짐작하고 있다. 그 역시 초파리 연구자이고 매우 급진적인 미국인 과학자인데, 나는 아주 오래전 그의 래디컬함 속에서 그 어떤 휴머니티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eLife의 편집장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도 별다른 희망을 걸지 않았었다. 실제로 eLife의 초파리 논문들은 HHMI 자넬리아 연구소의 몇몇 영향력 있는 과학자들과 그 주류 연구자들이 만든 일종의 카르텔 속에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내 생각엔 eLife가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학술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급하게 논문을 내야 하는 이들의 논문 휴지통이 될 것이다.
오늘 네이처에서 “Peer review by committee?” 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Stacks라는 새로 생긴 학술지를 소개했다. 생태학자 데이빗 그린 David Green에 의해 시작된 Stacks는 그린이 직접 경험했던 학술출판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에디터 없이 리뷰어들의 위원회에 의해 논문 출판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스택스 측에선 현재 최대 7명까지 리뷰어를 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향후 시스템을 개선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한다. 에디터가 없는 리뷰어 위원회라는 시스템이 과연 잘 작동할지 지켜볼 일이다.

내가 Stacks 의 방식이 eLife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스택스가 리뷰어들의 이름을 가급적 모두 공개하고, 그들을 논문의 공동연구자 Collaborators라는 명칭으로 논문 저자들 아래에 명기한다는 데 있다. 즉, 리뷰어가 원한다면 그들은 이 논문의 공동연구자로 리뷰작업의 결과인 논문을 자신의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이 방식이 작동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현재 학술지 동료평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리뷰어의 기여에 대한 댓가가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리뷰어들은 대부분 익명으로 남거나, eLife처럼 원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견을 논문에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리뷰어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리뷰한 논문에 내 이름이 공동연구자로 기재된다면? 나는 꽤 많은 연구자들이 주저없이 논문의 리뷰어로 활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방식은 리뷰어 위원회에서 리뷰를 하기로 검토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논문의 질적 저하를 유도하지 않을 것이다. 에디터의 전횡도 위원회 시스템 속에서 견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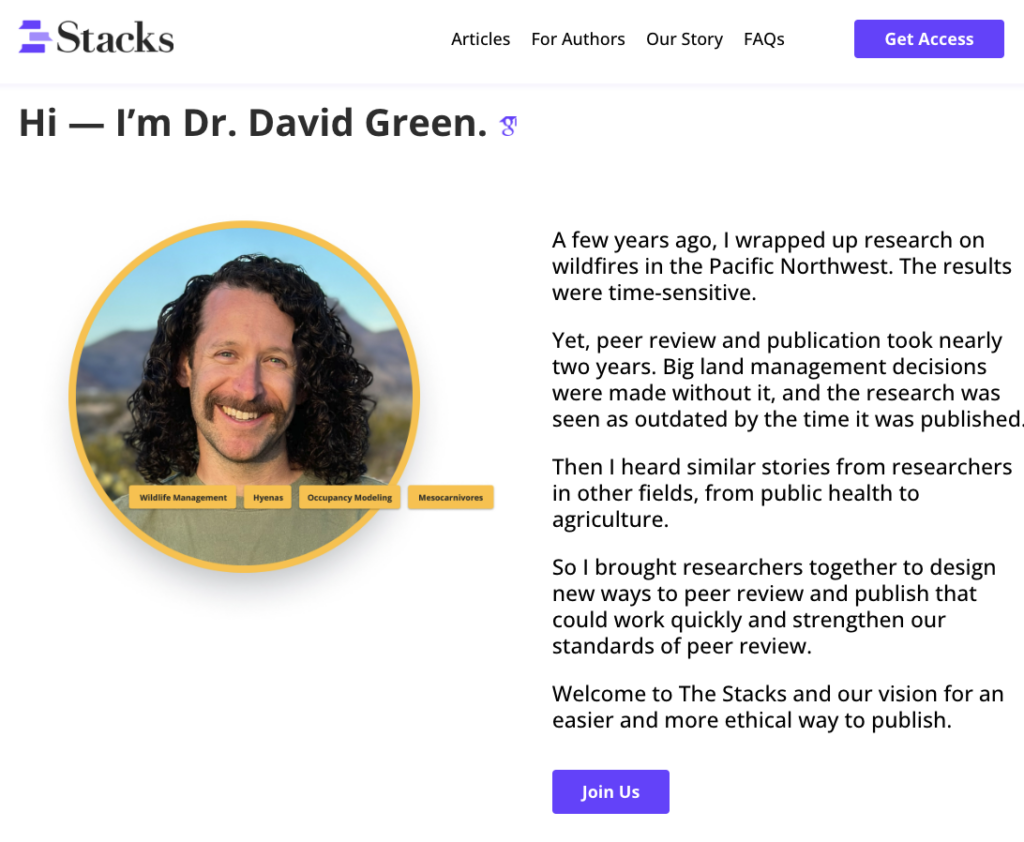
스택스의 시도가 성공할지 아닐지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완전히 망가져버린 학술지의 동료평가 시스템 속에서, 이 시도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남긴다. 우리가 동료평가를 혁신하려면, 반드시 리뷰어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 욕망을 시스템 안으로 제도화시켜야 한다. 스택스는 적어도 그 일을 시작했고, eLife는 그 점을 간과했다.
그나저나 지금 쓰고 있는 뉴로펩타이드와 수용체에 대한 종설논문인듯 연구논문인듯 알쏭달쏭한 논문은 eLife에 밀어넣어봐야겠다. 굽신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