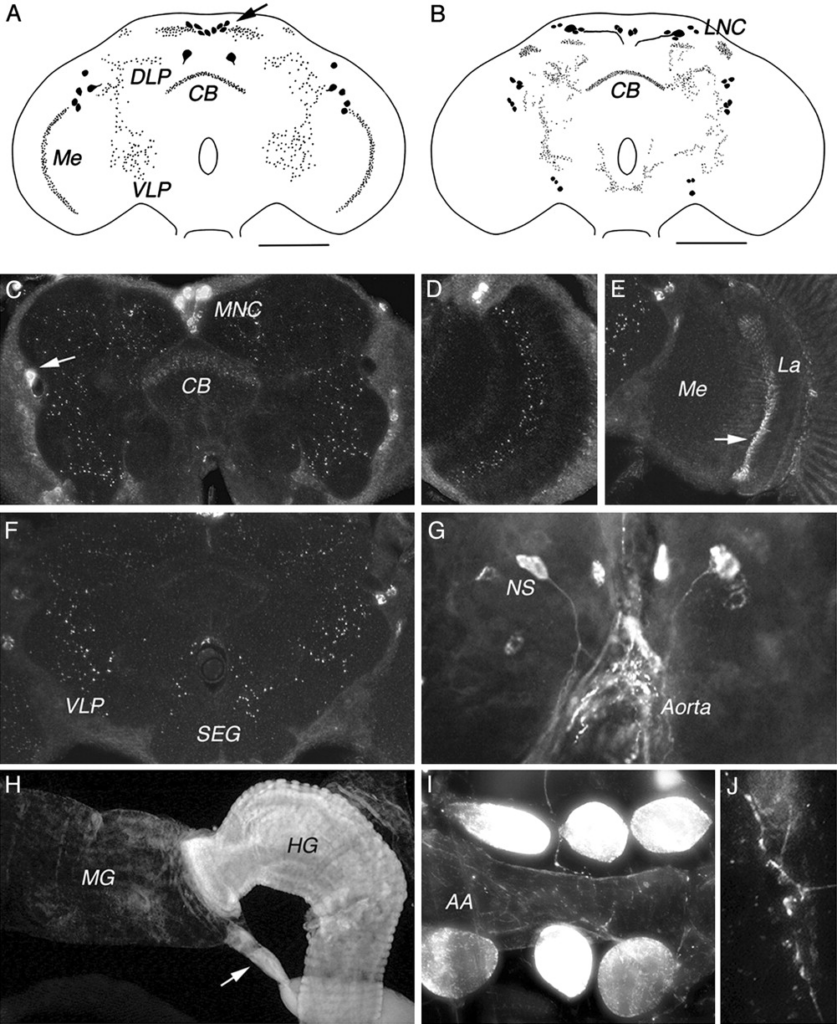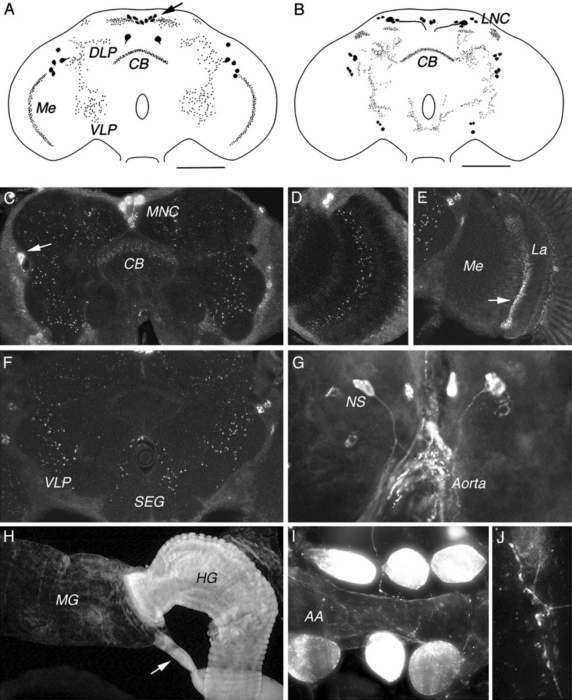과학자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할 때가 언제일까. 편차가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논문을 쓸 때가 아닐까 싶다. 대학원생이 논문을 읽는 편수는 아마도 년차가 더해질 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대신 대부분의 논문을 제목과 초록을 일별하는 공부가 표준이 된다. 논문을 깊이 읽는 훈련은 대학원의 초반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특별한 과정이다.
자신이 속한 분야의 모든 논문을 다 읽는다는건 불가능하다. 논문읽기란 백과사전식 읽기가 아니라, 자신의 연구주제를 따라 그 연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논문읽기의 중심엔 항상 자신의 연구주제가 놓여있어야 한다.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논문을 선별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참조하는 능력이 대학원생이 반드시 독립연구자가 되기 위해 길러야 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논문을 아예 안 읽는건 큰 문제다. 자신의 분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아무런 감도 없는 과학자는 연구를 접는게 맞다. 내가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라는 자들이 대부분 그랬다. 그래놓고는 학생 논문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교수는 실험실의 가장 큰 두뇌다. 그 두뇌가 논문 읽기 훈련을 안한다면, 그 실험실은 반드시 망한다.
반대로 논문만 읽는 것도 문제다. 실험생물학 실험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실험이다. 논문을 너무 많이 읽으면 정보과잉상태가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혼란스러워진다. 가장 중요한 논문을 교범으로 삼아 실험을 수행하고, 이 경험으로부터 논문읽기와 실험을 보정해가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논문을 적당한 수준에서 구조적으로 읽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확증편향 때문이다. 논문을 너무 많이 읽어서 해당분야의 지식을 100% 아는 과학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반드시 데이터 해석에서 확증편향에 노출된다. 논문을 적당히 읽은 과학자는 일부러 데이터를 편향되게 해석할 수 없다. 그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된다.
논문을 쓰다가, 해석을 미뤄두었던 데이터가 기가 막히게 다른 과학자의 연구결과와 들어맞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오늘도 그런 경험을 두 번이나 했다. 신기할 뿐이다.